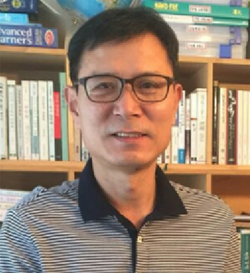
사람과 사람사이에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시 <섬> 전문(全文)이다. 지극히 짧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인간사회 관계망의 원초적 갈등을 함축하고 있다. 압축이 극에 달하면 폭발한다. 일촉즉발을 머금고 있는 이 시(詩)에 박덕규 시인은 슬쩍 성냥을 긋는다.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있었다. 그/ 사이에 있고 싶었다./ 양편에서 돌이 날아왔다./ <사이>
지금 대한민국은 극한의 대립 속에 놓여있다. 6.25 전쟁이후 이렇게 심하게 내부적 갈등을 겪었던 때가 언제 또 있었던가 싶다. 정확히 양편으로 갈라져서 가슴속에 장돌 하나씩 품고 서로를 노려본다. 지금 행여나 중재를 한답시고 가운데에 섰다가는 양쪽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기나 한가 회의가 든다.
1781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인류에게 ‘섬’ 하나를 제시했다. 그 섬 이름은 ‘선천적 종합 판단의 신대륙’이다. ‘진리의 섬’이라고도 한다. 칸트는 자신의 역작 <순수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物自體; Ding an sich]을 사유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이성(理性)이 작동 될 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으로 판단하는 ‘후천적(a posteriori) 분석판단’과 경험 이전에 본유하고 있는 ‘선천적(a priori) 종합판단’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했다.
어려운 철학 논리지만 손쉬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태어나서 열대지방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원주민이 눈(雪)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아무리 자세히 관찰한다고 해도 그것의 정체가 ‘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의 정신세계에는 ‘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을 보고 ‘눈’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경험과 개념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칸트는 그러한 능력이 선천적이기 때문에 ‘선천적 종합판단’이라고 했다.
칸트는 또한, 선천적 종합판단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은 물론 경험하지 못한 대상, 즉 도덕적 윤리나 형이상학적인 지식도 습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인식 질료가 같고, 우리의 감성과 오성이라는 본유 형식 또한 같다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은가. 칸트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이성을 실제적인 삶 속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왜 우리가 그 길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 이성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du kannst, denn du sollst)’고 주장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사이’도 있고 ‘섬’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정신세계는 제각각 달라서 사람사이에 있는 섬도 위치나 모양이 제각각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이데올로기까지 겹치면 상륙 불가능의 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곳에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른다면 우리는 칸트의 의무(pflicht)와 당위(sollen)적 도덕철학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하기 때문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선천적으로 지향점이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칸트의 말대로 본유 형식이 같고 인식되어야할 대상이 같다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바라는 것도 하나 되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통합하는 시대정신이 첫 번째 국정 의지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우리도 이제는 제발 각자 품고 있는 증오의 돌을 내려놓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