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룡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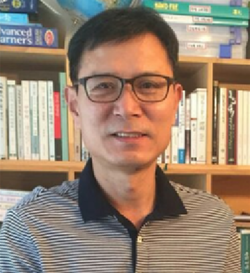
지금 울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선뜻 동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울진을 방문한 외지인들은 상당히 공감할 것이다. 『칼의 노래』 『남한산성』 등을 써서 한국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 중인 김훈은 울진 후포를 구경하고 이런 글을 썼다.
“해안선을 바짝 끼고 달리는 거대한 산맥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윽박질러, 물에 빠뜨려버릴 듯 바닷가까지 밀어붙였고, 거기까지 치달아 내려온 검은 산맥의 그 사나운 앞발들이 가파른 수직 경사를 이루며 물속으로 잠겨드는데, 삶의 배면(背面)을 태백산맥이 '쾅쾅 못질해' 막아버려, 삶은 아무런 보호막이도 없이 해풍과 파도에 쓸리우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산맥이 사람들의 삶의 배면을 차단하고 있지만, 내륙 쪽으로 눈을 돌려도, 산맥의 커다람과 무서움은 그 전체의 윤곽을 보여주지 않고, 커서 보이지 않는 검은 산맥은 삶의 너머에서 ‘흉흉한 소문’처럼, 그러나 확실하게 버티고 있다.”
울진에 살 때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사방이 트인 곳에 살다가 가끔 고향을 찾아가면 김훈의 저 문장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바다 쪽을 보다가 고개를 잠시만 돌리면 여지없이 거대한 산맥이 시야를 가로막는다. 내륙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탓에 울진에서 지는 해는 산을 넘기 전에 노을을 만들지 못하고 윤곽만 희미해진 산맥의 검은 장막 너머로 곧바로 떨어진다.
검은 산맥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우거져 색이 더욱 짙어졌고, 숲이 부풀어 거대해진 형체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것 같았다. 그럴 때 김훈이 언급한 ‘흉흉한 소문’이란 표현이 떠오르곤 했다. 그 소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도 그 불안의 실체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건조한 봄철 영동지방에 부는 강풍 양간지풍(襄杆之風)은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졌고 울진도 그 범위 안에 든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연 그 자체가 보전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자연보호’에서 보호라는 말은 사람의 손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사람들이 살다가 떠난 자리를 폐허라고 하지 않은가. 예전의 농촌 풍경이 아름다웠던 것은 인위와 자연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치 좋은 농촌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칭송하지만 그 경치는 대부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일궈놓은 것이다. 농지뿐 아니라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다. 자연과 인간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경치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폐허가 된 농촌 풍경만 남는다.
이번 산불로 울진의 거대한 산맥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쏟아온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사람의 접근을 막고 산불감시 초소를 늘려왔지만 화재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금강송 군락지를 보존할 수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 산불이 지나간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복구와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복구는 원래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활용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금강송과 송이 생산지 등은 복구에 중점을 두고, 사람이 접근 용이한 지역은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에서는 리조트 골프장 레저타운 등을 염두하고 있는 듯하다. 생각을 넓히면 대관령 목장 같은 풍경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녹차 단지도 가능하고 울릉도처럼 산나물을 생산해도 될 것이다. 미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이 상품 되는 세상이다.

